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과 '머리'의 조화라고 하였습니다.
따뜻한 가슴(warm heart)과 냉철한 이성(cool head)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비로소 개인적으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과 '이성'(理性)의 인간학이고 사회학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성은 비정한 것이 되고 이성이 없는 사랑은 몽매(夢昧)와 탐닉(眈溺)이 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내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먼저라는 당신을 어둡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반성하라'는 말을 우스워하였습니다.
인간의 사고(思考)가 이루어지는 곳은 심장이 아니라 두뇌라는 사실을 들어 그것을 비웃기까지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성주의(理性主義)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오만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란 땅 위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그 흙 가슴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체(體, hard-ware)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용(用, soft-ware)이 실릴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가슴을 떠나는 것은 '질'(質)을 버리고 '양'(量)을 취하는 것이며 사용가치(使用價値)를 버리고 교환가치(交換價値)를 취하는 것이라던 당신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그 토대에 대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가슴'과 '사랑'에 대하여 겸손한 생각을 길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돌베개, 61~62, 65쪽).
살면서 문득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왠지 모르게 어수룩해 보여도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넉넉해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수다히 정(情)을 베풀고, 남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각박하고 인정이 메마른 사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자기주장이 확실한 사람들, 제 몫을 정확히 따지는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발견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날로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더욱 경쟁적이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더욱 살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아니,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대로 머리는 잘 돌아가는 편인데, 인간다운 삶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은 언제부터인가 내게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는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때가 잦습니다. 삶이나 신앙이나 운동이나 모름지기 핵심은 사람들 사이에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모두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은 이 핵심에서 무척이나 비켜 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하느님의 바보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인간이라면, 참신앙인이라면 조금은 어수룩해 보여도 마음만큼은 넉넉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시로 여겨집니다.
가볍게 웃어넘길 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세상의 바보가 된 사람들, 남들 위에 군림하려 들고 어떻게든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세상 욕심에 믿음으로 재갈을 물리고 그 대신 남을 섬기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해도 우리 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구원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이 사회와 이 겨레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바보 됨의 길입니다.
교회 갱신의 구호도 필요하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민주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가슴, 어진 마음, 해맑은 동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인간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뭔가 큰 을 이루겠다는 야망 이전에 우리의 인간성이 날로 맑아지고 착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성의 변화야말로 기독교의 근본 목표요 내용입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에 몸담아 사는 '사람'들의 변화로 귀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 운동은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노력을 보다 확대하여 '인간다움'이 실종된 교회와 사회의 갱신을 추구하는 운동,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자본주의적' 인간형에서 해방된 어질고 남을 위할 줄 아는 '공동체적' 인간형의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인간미 넘치는 사회를 창조하는 운동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의 청년 예수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인간성의 모범이 된 것은 그의 그 무슨 신비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요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비상한 통찰력이나 빼어난 두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촌구석에서 이 땅의 여성 농민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마리아의 아들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 아무런 공식 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 예수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짓밟히고 억눌린 생명 하나를 보아도 명치끝이 아파 오는 어질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권세가나 유식자들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서 삶의 아픔과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몹시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인간의 한구석에는 하늘 마냥 맑고 순수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또한 담겨 있다는 인간의 선성(善性)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나마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정을 베푸는 인간적인 사람들의 인간적인 공동체, 하느님나라에 대한 끈질긴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겨자씨 한 알(막 4:31)'처럼 미약하기만 한 그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마 6:10)'에 실현되리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청년 예수의 그런 가슴, 마음, 믿음, 희망, 신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가난, 노동, 가난한 이웃들과의 교제, 그들과 함께한 많은 동고동락의 시간, 기도와 묵상, 자신과 타인의 인간성에 대한 깊은 내면적 성찰, 주변 자연 세계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사회의 모순과 그 모순을 타파하려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에 관한 진지한 사색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히 12:2)'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으로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청년 예수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 앞에 바치는 겸손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서 오고 가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사람됨, 참된 구원의 길과 진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의 '모든 죽어 가는 것(윤동주)'을 사랑하기 원했기에 그는 십자가에 달렸어도 끝내 하나의 '길'로 부활한 것입니다.
청년 예수의 생애,
그가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펼쳐 간 삶은 한 편의 휴먼 드라마요 가슴 미어지는 서정시입니다.
따뜻한 가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깊고 넓은 가슴, 생명 사랑 인간 사랑 민중 사랑의 해맑은 가슴, 그 가슴과 맞닿은 '냉철한 이성',
인간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체의 반생명적인 것들의 본질을 꿰뚫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철학,
부드러운 듯 예리한 사랑의 인식 하나로 청년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깊고 폭발적 힘이 깃들인 한 편의 인간적이며 역사적인 서정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정연복 / 한국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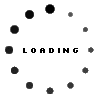
댓글0개